 2025.07.18 등록
2025.07.18 등록
[앵커] 지난 14일은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을 기념해 제정됐는데요.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윤재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현재 한국 사회에는 3만4천명에 가까운 탈북민이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는 북한을 탈출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의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줄여서 '탈북민' 또는 '탈북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는 2005년 '새터민'을 공식 용어로 제안했지만 탈북민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만 탈북한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탈북'은 분단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함경북도 아오지 출신의 청년 작가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탈북민' 혹은 '이탈주민'이란 용어는 존재의 단절을 불러온다고 비판합니다.
<조경일 / 청년 작가·피스아고라 대표>
"탈북자, 이탈자라고 하면 거기(고향)를 버리고 온 사람이 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끊어져 버리게 돼요."
어느 정권이든 국민통합을 외쳤지만 분단체제가 낳은 존재를 호칭하는 '이탈' 혹은 '탈북'이라는 꼬리표를 떼내진 못했습니다.
굳이 정체성으로 호명돼야 한다면 차라리 '북향민'이란 용어를 쓰자고 조 대표는 제안합니다.
분단과 체제대결, 이념을 넘어서는 '실존' 그 자체로서, 그저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으로 불리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거기엔 '단절'이 아닌 '연결', 통일에 대한 '희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경일 / 청년 작가·피스아고라 대표>
"우리가 북향민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면 고향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버린 게 아니라 우리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떠나왔음에도."
'탈북민' 혹은 '이탈주민'이란 호칭을 '북향민'이란 용어로 대체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향민들 사이에선 수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유튜브 박통통TV 진행자, 2020년>
"북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 불러주는 거, 어떤 정치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를 담지 않은 정말 중립적이고 괜찮은 이름이구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에 차별성과 폭력성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북향민'을 공식 용어로 채택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 출신으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북향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경 씨는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말합니다.
<김미경 프란치스카 로마나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팀장>
"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북향민의 날로 불릴 수 있게끔 법적으로도 좀 정례화를 해주시고, 사회적으로도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적극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북향민들은 먼저 온 통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북향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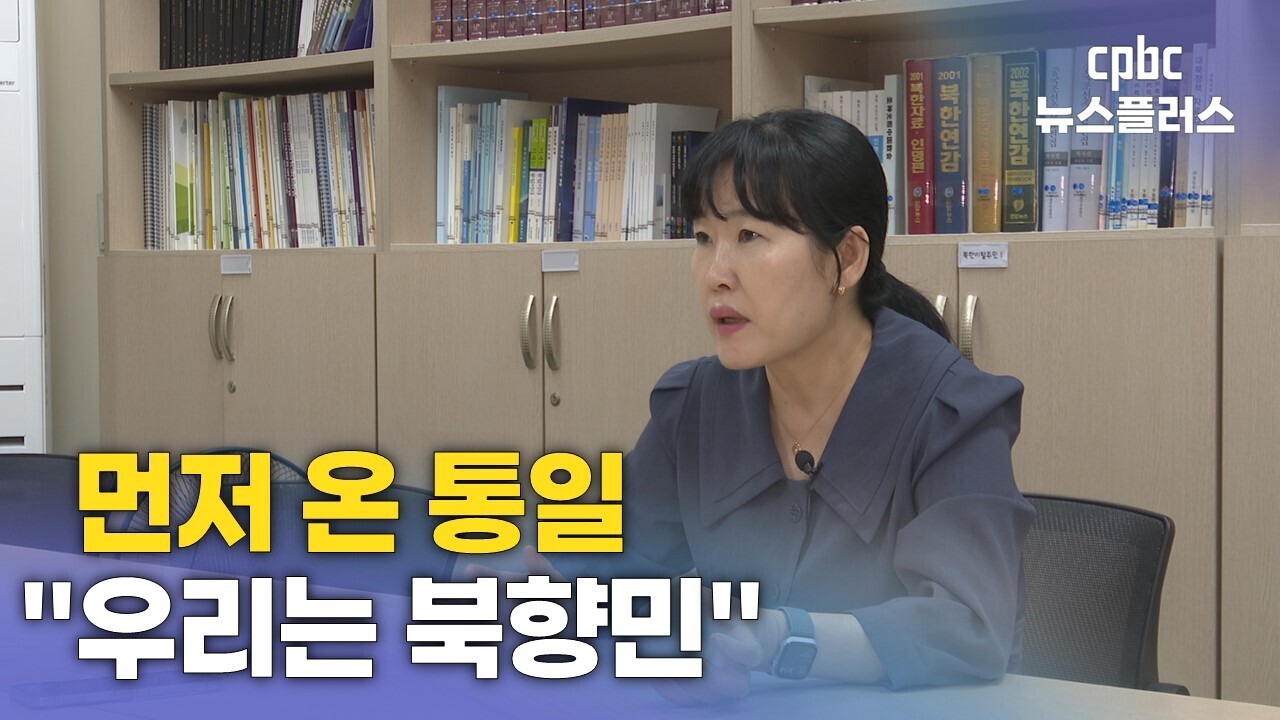
CPBC 윤재선입니다.







